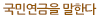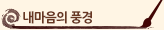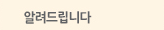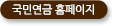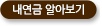내마음의 풍경
셋이라서 좋다(백두현 / 충북 제천시)둘도 많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좀처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사회분위기와 다르게 자식이 셋이다. 그렇다고 내가 정부정책에 잘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더 아니다. 어느 날 불쑥 복덩어리 셋째가 찾아왔을 뿐이다. 아내는 울상이었지만 나는 돌아서서 쾌재를 불렀다. 그때 나는 퇴직 같은 것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던 나이라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 여겼다. 주변에서는 국가에 충성한다고 치켜세우기도 하고 부자 아빠라고 빈 인사를 건넸다. 그 녀석이 커서 며칠 전부터는 영어학원을 다닌다. 저녁밥을 먹다 말고 학원 선생님께서 영어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브라이언’이라고 자랑을 한다. 그런 녀석을 보며 밥풀이 튀도록 웃어대는 내게 ‘남들은 며느리 본다고 초대장을 보내오는데 걱정도 안 되냐’며 아내가 핀잔을 주었다. 자식 많아야 무슨 소용이냐는 말을 자주 듣는다. 말년에 뭔 고생이냐는 위로의 말도 듣는다. 힘들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니 정신 챙기라는 말이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 자식을 키우던가? 자식을 키우면서 들인 공은 이미 키우면서 다 보상받는 것이다.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에 뿌듯했고 재롱떠는 모습에 즐거웠지 않은가. 일가를 이뤄 늘 시끄러웠고 저녁마다 행복충전을 받았으니 족하다. 산다는 것은 시끄럽게 울고 웃는 일상일 것. 외로워서 힘든 것보다 넘쳐 부딪히는 소리가 더 좋다. 물질적인 것은 내리사랑이니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줄 때 더 행복한 이 사랑을 무엇으로 바꿀까.
어려서는 넘어질까 안절부절도 했었고 좀 더 자라서는 의미 없는 받아쓰기 성적에도 사람구실을 못할까 걱정도 했었다.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웠더니 나중에 크면 아빠같이 얼굴이 변할까 두렵다는 섭섭한 말도 들었다. 그러면 어떤가. 자식 키우는 행복은 즐거울 때만 느끼는 게 아닌데. 노심초사하는 한 아비의 마음도 사실은 행복이다.
이제 나이 오십이 넘어 생각이 실용적인 나는, 말 많은 개그프로나 허무맹랑한 만화영화 같은 것에 흥미를 잃었다. 그러나 막내아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은 나는 아직도 만화영화 같은 것을 보며 산다.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둔 녀석이 신경 쓰여서인데 이런 고만고만한 일상이 나로서는 행복한 것이다. 자식 키우면서 생기는 고민은 고민이라 여기면 고민이고 행복이라 여기면 행복이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셋이라서 좋다. NPS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찾는 일상의 행복(박정도 / 부산시 사하구)평범한 사람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란 무엇일까? 많은 돈일까 거대한 권력일까, 코흘리개 아이도 알만큼 이름을 떨치는 일일까? 살아가는 방식이나 주관에 따라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잣대는 다르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이란 큰 걱정 없이 의식주 해결하며 사는 일일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행복의 잣대는 거창하지 않다. 가족 건강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하는 일에 큰 시련이 없다면 만족한다. 행복이나 기쁨은 산 너머 바다 건너 있지 않고 주변의 사소한 것에 있다.
어느 철학자에게 임금이 찾아와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햇볕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는 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선현은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아 부른 배를 두드리며 노래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주변 사람들과 인정과 사랑을 나누며 산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다. 일을 하는 틈틈이 산책을 즐기고 콧노래를 부르며 일상의 여유를 즐긴다면 마음은 벌써 태평성대의 한가운데 있는 셈이다.
탐욕을 부리면 행복은 저만큼 달아난다. 주어진 분수에 맞춰 살고 안빈낙도하겠다는 마음을 지니면 소박한 일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억만장자가 되고, 고대광실 집을 짓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힘이 있어도 마음이 옹졸하고 여유가 부족하면 행복은 느끼지 못한다.
행복을 멀리서 찾는다면 늘 허둥지둥 갈팡질팡 헤매며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여 서면 앉기를 원하고, 앉으면 기대기를 원하고, 기대면 눕기를 원하고 누우면 잠들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편리와 탐욕을 추구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지라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순리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물 흐르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 산다면 행복은 시나브로 찾아든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주변의 일상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NPS
진정한 스승(우정렬 / 부산시 중구)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49년이 지났지만 6학년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자신의 청춘을 제자 사랑과 가르침에 모두 바치신 분, 늘 용모가 단정하고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으로 기억된다.
60년대 중반이었던 당시는 보리밥과 강냉이죽으로 끼니를 이어갔던 시절이다. 그래도 중학교 입시를 앞두고는 무척 열심히 공부를 했다. 특히 여름 방학 때에는 아침 7시부터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였는데, 요즘처럼 보충 수업비를 따로 내던 시절이 아니어서 선생님이 무료로 봉사를 해주신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기 전에 출근하셔서 수업 준비를 하시고, 방학 중 보충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지도를 해주셨다. 종종 가난한 학생들은 댁으로 불러 개인지도를 해주시며 식사까지 해결해주셨다. 또한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월사금을 직접 내주시기도 했다.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가정이 어렵고 힘든 농촌 학생들에게 큰 정을 베풀고 빈틈없이 학습 지도를 해주어 정말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사표(師表)가 되었다.
우리가 졸업한 뒤, 선생님은 부산으로 전근을 가셨다. 그리고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사모님의 사업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중도에 교사 생활을 그만두셨다고 하여 아쉽고 안타깝기만 했다. 필자도 고교에서 34년 째 교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도 그때 우리 선생님만한 분은 아직껏 발견하지 못했다.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 참교육을 실천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 선생님을 모시고 사은회라도 열어보리라 다짐해본다. N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