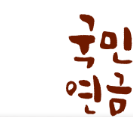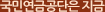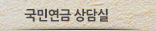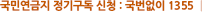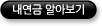내마음의 풍경
내마음의 풍경 1. 자식들의 짐(홍순희) 친정 엄마가 몇 년 전 심장 수술을 받으셔서 인공 판막을 가슴에 달고 사신다. 가끔 엄마 품에 기대면 정말 그 재깍재깍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엄마는 젊었을 적 고생을 많이 하셔서 허리가 좋지 않으신데, 이 심장때문에 수술을 받으실 수가 없다. 재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잘 걷지 못하시고 자꾸 넘어지셔서 진료를 받아보니 파킨슨 증후군이셨다. 그동안 중심을 잘 못 잡으시고 자꾸만 넘어졌던 이유가 파킨슨 증후군 때문인 줄 모르고 재활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엄마한테 심한 말을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파킨슨 증후군은 우울증을 동반하는 병이라고 하니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 것인데도 말이다. 병간호를 위해 친정집에 갈 때마다 엄마는 짐이 되어 큰일이라며 우시곤 하신다. 내 아이가 아프면 잠도 설치고 피곤한 것도 모른 채 간호를 하는데, 엄마가 병상에 누워계신데 자식 아픈 것만큼은 속이 타 들어가지도, 잠을 설치지도 않았다. 내가 어릴 적 몸이 아플 때 엄마는 속을 태우며, 잠도 못자며 나를 간호했을 텐데 말이다. 어린이 집에서 5살 아들을 태워 집으로 가던 길에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운전하면서도 엄마, 엄마하며 우는 나를 아이가 위로해주었다. “엄마,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울지 말고 참아야 할머니가 힘을 내시지. 엄마가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 이 한마디에 참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엄마 할머니랑 아빠 할머니랑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빠 할머니가 안 아프시니까, 엄마도 안 슬퍼할 거 아냐.”,“그럼 아빠가 슬퍼하시잖아.”, “아빠는 힘이 세서 마음 안 아플 거야.” 아들의 눈에는 우는 엄마가 약해 보였나보다. 살면서 위안이 되는 아이의 한마디가 나를 지켜주는 것일까? 부모님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는데, 정작 자신이 아프니 자식에게 짐이 될까 안절부절 하신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부모님은 내 짐이 아니라고 되새기면서도, 나는 정작 나이 들어 아이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내마음의 풍경 2. 장모님의 ‘전화 예약 서비스(류용규) 며칠 전 일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아내가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부리나케 전화를 겁니다. 친정 엄마, 즉 저의 장모님께 말입니다. “엄마! 아까 전화하라고 하셨는데 깜빡 잊었었네. 뭔 일 있어요?” “일은 뭔 일이여. 바쁜디 왜 전화하고 그랴. 연속극 볼랑께 그만 끊는다. ” 집사람은 한참이나 말을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더니 울먹거리며 말합니다. “엄마가 아까 낮 12시 반에 꼭 전화해 달라고 해서 한 건데….”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장모님은 친구분들이 자식이 사 준 휴대전화 자랑을 한다며 은근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귀한 물건이어서 우리는 마지막 효도일지 모른다며 휴대전화를 사드렸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은 가끔씩 아내더러 “몇 시쯤에 전화 좀 넣거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부모 자식 간에 사전 전화 통화 예약서비스(?) 같은 것이지요. 장모님은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마을회관에 다니시는데 그곳에서 보란 듯이 “내 아들, 딸, 사위도 잘나가고 있다”는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화 예약서비스는 바로 이 타이밍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 ‘예약서비스’를 시행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유를 딸이 잊고 있다가, 마을회관이 아닌 집전화로 연락을 했으니 그렇게 금방 끊으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항상 같은 말씀만 되돌아 왔다던 아내의 말이 떠오릅니다. “박서방 직장 잘 댕기고? 아그들도 잘 크제? 늬덜이 지난 번에 사서 보내준 한우 사골뼈는 잘 끓여 먹었다. 뭘 맨날 그런 걸 사서 보내냐. 큰아는 요번에 푸랑순가 어디 갔다 왔다는디... 작은아는 회사에서 뽀나스를 받았다나 뭐라나...”하시며 구구절절 자식 자랑을 하시던 레퍼토리. 다들 평범하게 사는 자식들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인 듯합니다. 그럴 때 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늘 그런 부모의 마음 때문에...
내마음의 풍경 3. 엄마와 선생님 사이(황은경) 새벽에 어김없이 몇 번씩 깨서 찡찡거리는 둘째 덕분에 아침은 여전히 달갑지 않다.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 아침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데려갈 채비를 한다. 그 와중에 ‘빨리하자!!’, ‘장난 그만하고!’, ‘말 안 들을 거야?’, ‘맴매 들어?’ 소리를 연속 반복해 줘야 겨우 준비를 진행할 수 있다. 아이들 독촉하며 출근 준비도 해야 한다. 후다닥 준비를 마치고 나면 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꼭 당부를 한다. “집에서는 엄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뭐라고 불러?” “선생님~” 늘 물어보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는 아이들이 고마우면서도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는 환경에 미안한 마음이 가득이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을 살펴야 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 아이도 직장에서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줘야 한다. 내가 원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다양한 업무들로 가득하다.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에서부터, 학부모 상담, 교직원 관리, 교육 계획 등의 그럴싸한 어휘로 포장되었지만, 사실 일하는 나의 모습은 별로 고급스럽지는 않다. 이런저런 시달림이 끝나고 나면 행정 업무도 봐야하고 교육 계획도 세워야 된다. 왔다 갔다 하며 간혹 마주치는 큰 아들은 엄마와 말을 섞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눈이 마주치면 머쓱해한다. 퇴근하여 집에 가는 길에 6살 난 큰 아들이 물어 본다. “선생님, 어린이집 출발 했으니까 차 안에서는 엄마라고 해도 돼?” 우리는 다시 모자 지간이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화 속에서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입에 배인 ‘선생님’소리가 몇 번 더 나온다. 엄마인지 선생님인지 간혹 헷갈려 하기도 한다. 집에 도착하면 두 아들은 끝없는 에너지를 발산한다. 딸 없는 것도 서러운데 우왁스러운 두 녀석을 상대 하려니 장난하다 맞고 다치는 것은 다반사이다. 잘 시간이 되면 오늘 하루도 별 탈 없이 무사했음에 안도하고 감사하기 시작한다. 일주일에 5일, 한 달에 20일, 일 년에 240일 가량 나는 위와 비슷한 일과를 보낸다. 이런 일과 속에 소소한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조미료처럼 더해져 내삶에 감칠맛을 더한다. 엄마와 선생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의 토지에 물과 양분과 손길을 주어 아름다운 결과물을 싹틔워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한다.